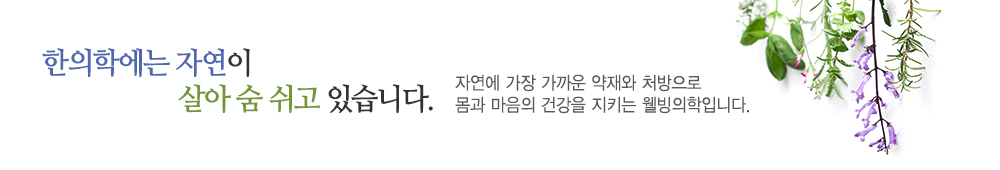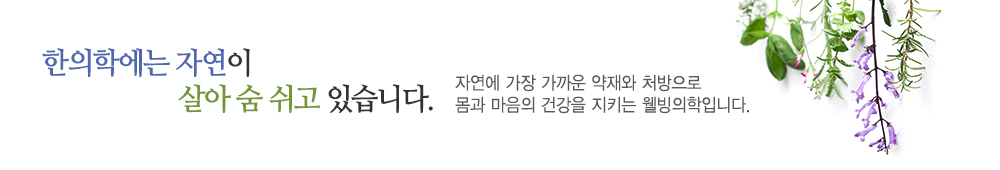오늘의 마지막 의뢰품, 민속품 한 점인데요. 이게 그럼 약을 담던 건가요?
의뢰품은 약 약(藥)자에 벼루 연(硏)자를 써서 약연(藥硏)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약재를 가루로 빻거나 즙을 내는 의료기구입니다. 손잡이가 달린 건, ‘연알’또는 ‘공이’‘옹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가 한 세트인 거죠.
약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기구인 약연은 어느 분의 소장품일지, 의뢰인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색다른 민속품을 의뢰해주셨는데요. 직접 소장하고 계신 건가요?
이광연
네, 친한 형이 지방에서 작은 박물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께서 제가 한의사니까,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선물로 주신 겁니다.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았는데 한의사셨군요,
약연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의뢰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광연
약제 도구에 대해서 시청자 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싶고, 약연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보면 한의학의 역사 얼마나 깊은지 한 번 되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뢰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약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걸 어떻게 쓰는 걸까요?
축을 끼운 원형의 연알을 앞뒤로 굴려서 빻는 건데요. 여기엔 과학적 원리를 적용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습니다.
약연의 안쪽 파인 부분을 보면 가운데가 가장 낮고 양쪽 끝으로 갈수록 높아지죠? 연알이 곡선 상에서 궤적을 따라 움직이도록 제작한 건데요. 적은 힘으로도 쉽게 약재를 빻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단진자의 원리가 쓰였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혹시 약연에 의학적 원리도 숨겨져 있는 거 아닐까요?
한의사님! 어떤가요?
이광연
약연은 동양의학의 기본원리인 음양법칙에 부합되게 만들어졌다고 보는데요. 여성은 음(陰)이고, 남성은 양(陽)에 속하는데 음은 정(靜)하고 양은 동(動)하다고 하죠?
움직이지 않는 연은 대지를 뜻하는 여성, 움직이는 연알은 모습이 태양과도 비슷하고 남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음과 양의 이상적인 화합에서 바른 것이 생기고 더불어 약도 잘 갈린다고 본 겁니다.
과학적 원리에 음양의 조화까지 이런 게 발전해서 지금의 의학기술이 탄생한 거겠죠?! 혹시 지금도 이런 약연을 쓸 때가 있나요?
이광연
요즘은 기계의 분쇄 기술이 훨씬 좋기 때문에 약연을 쓸 필요가 없고요. 저도 역사 공부할 때나 봅니다
위원님! 길쭉한 게 가지 같기도 하고 완두콩 껍질 같기도 한데요. 약연이 배를 닮은 거라고요?
네, 우리나라와 일본에선 약연이라고 부르지만, 중국에선 배 선(船)자를 써서 약선(藥船)이라고 합니다. 모양이 배처럼 생겨서 붙인 이름이고요.
약연은 넓은 의미로는 약재를 가루로 만들던 맷돌, 절구 등 모든 기구를 포함시킬 수 있지만, 좁은 의미로는 의뢰품과 같은 배 모양의 약연만을 가리킵니다. 좀 더 미세하게 갈 때 사용하는 사발 모양의 약연은 유발이라고 하고요.
나무로 만든 약연은 본 적이 있는데, 의뢰품 같은 건 저도 처음 보거든요. 위원님! 아무래도 금속으로 약연을 만드는 게 훨씬 힘들고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단단한 금속을 가지고 이렇게 날렵하게 만드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금속으로 만든 약연은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쓰는 사람의 신분이나 처지에 따라서 나무, 돌, 청동이나 쇠 같은 금속, 유리, 심지어는 옥이나 은 같은 값진 재료가 이용되기도 했는데요. 나무 약연이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이 돌-금속 재질의 약연은 사대부나 궁중에서나 쓸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상당히 귀했다는 거죠.
한의사님! 혹시 약의 종류와 성분에 따라서 약연을 다르게 사용하기도 했나요?
이광연
철과 닿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기철(忌鐵) 이라고 하는데요. 철과의 접촉을 피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예전의 철은 지금의 스테인레스보다 산화가 잘되기 때문에 녹이 잘 슬었겠죠. 그래서 즙이 많은 약재들은 금속으로 만든 약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철과 닿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약재는 인삼과 생지황, 하수오가 대표적인데요. 인삼, 특히 밭에서 캐서 말리지 않은 수삼이 금속과 닿으면 약효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생지황과 하수오도 금속과 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강도가 단단한 주사, 석결명, 산골과 같은 약재들은 나무소재로 만든 약연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럼 약연에 따로 용도를 표시해 두기도 했나요?
독약이나 극약용은 섞이지 않도록 표시를 해두기도 했죠. 그리고 건강과 장수,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약연 외부에 십장생, 물고기, 용, 토끼 등 그림을 조각하거나 수복강녕 같은 글자를 새기기도 했습니다.
한의사님께서도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광연
200년동안이나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수 많은 약재들을 묵묵히 갈아준 약연을 본받아, 저도 한의학을 통해 많은 분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